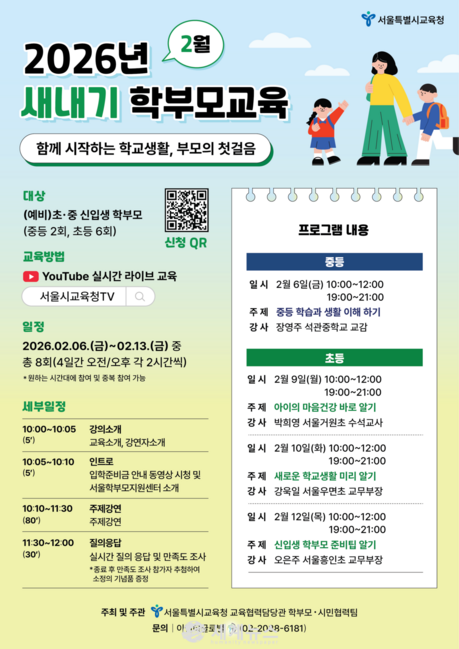- 국가채무 증가 속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역대급 부채와 재정적자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75조 9,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연말보다 34조 7,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국가 재정이 적자 상태에 빠지면서 빚을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발행 총한도의 41.1%에 달했다.
재정 수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된 재정 적자는 매년 100조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도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4.5%로 비기축통화 선진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건전성의 악화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추경 편성으로 인해 올해 적자성 채무는 885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정부 출범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 부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긴축 운용 기조와 세수 결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원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정책과 미래 세대 부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현재의 재정 지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40년대 후반부터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정부는 재정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의 고삐를 죄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다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고 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과 규제 개혁이 회복의 열쇠"라는 IMF 총재의 조언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